소설 속 화자가 기억을 더듬어 사라진 그의 애인을 추적하는 과정은 영화적 상상력과 소설적 상상력의 절묘한 결합을 보여줌과 동시에 또 다른 매체로의 스토리 확장을 예고한다. 꿈과 현실, 수조 안과 밖의 세계에 대한 대비를 통해 매체 전환 스토리텔러로서의 노련함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야기는 그 형태를 달리하면서 언제 어디서건 인류와 함께였다. 그래서 호모나랜스 (Homonarrans)는 인간을 이야기하는 동물로 정의하기도 한다. 디지털 진화 시대의 이야기는 미디어의 경계마저 허물어내고 있다. 그렇다면 문명의 태동과 함께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이야기의 생명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적어도 이 소설은 한없이 나약한 인간의 기억, 그 조작된 기억에서 근거를 찾은 듯하다. 이야기의 원천이 현실과 허상의 경계를 교묘하게 오가며 삶의 발전 가능성과 희망에 대한 무의식적 합의를 타진하는 데 있다는 듯이 말이다.
무모한 욕망의 무의식적인 합의의 타진은 극단적으로 치닫는다. 자식에 대한 사랑과 죄책감으로 연구 소장은 모두를 파멸로 이끈다.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는 고통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한필과 대조적이다. 이런 이들의 모습이 다시, 각기 다른 스노글로브 속에서 살아가는 듯한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다.
구성은 에피소드 한 편이 독립적인 스토리로 완결되고 다시 그 스토리의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를 탄생시킨다. 프롤로그를 보면 좀비 이야기인가 싶은데, 추리와 서스펜스가 이어지다가 스릴러로 바뀐다. 기억을 잃은 주인공 한필의 시선과 혼란스러운 감정, 하나씩 밝혀지는 뇌과학 연구소의 비밀, 영서의 정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이야기는 진행되고, 급기야 소설의 마지막에는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작가의 필체는 어떤 영화적인 장치보다 더 생생하게 이 모든 사건 현장을 전달한다.
‘의학에 개인감정이 섞여서 성공한 역사는 없어.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치료제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뭘 의미하는지 알겠나?’ (본문, p245)
‘아마도 마나샤 에피네프린 중독자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방법은 없을 걸세. 하지만 없애는 방법은 있네만. 그것은 갈증을 없애주는 거지. 마나샤 에피네프린에 대한 갈증만 남은 괴물이니까. 그것을 느끼는 감각기관을 없애야 해. 뇌를 파괴해야 한단 말일세. 그것은 곧 죽음이겠지.’ (본문, p247)
“우리가 이 안에 살고 있다면, 이 밖의 세계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그런 설정 말이에요.” (본문, p257)
작가의 말
프롤로그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제9장
제10장
제11장
제12장
제13장
에필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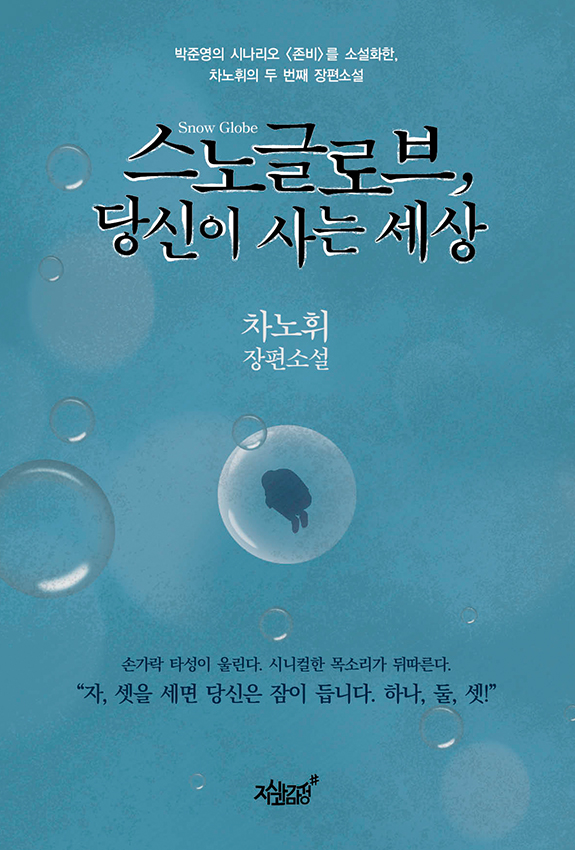

 070-4651-3730
070-4651-3730 ksbookup@naver.com
ksbookup@naver.com 지식과감성# 카카오플러스 친구 추가
지식과감성# 카카오플러스 친구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