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은 칼 구스타프 융의 말에서 시작한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을 두고 운명이라 부른다.”
무의식은 스키마(schema)로 작동되는데, 이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수용하는 도식이며 무엇이 지각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통제하여 환경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구축하는 기능을 일컫는다.
우리는 어느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존재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른다.
그 안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재단하고 심지어 심판까지 내리는 게 당연한 삶이 되어 버렸다.
칸막이는 높고 두꺼워졌으며, 그 칸막이에 이성과 합리, 과학의 이름까지 부여한다. 낯선 것을 경계하고, 안 그런 척 포즈를 취하지만 실은 내면의 성벽은 더 높이 쌓아 올리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현대의 작가란 그 성벽에 균열을 내고 구멍을 뚫어 다른 저편을 바라보게 하는 자일 것이다.
오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외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바로 작가의 글쓰기일 것이다. 조안영의 장편소설 『스키마』에서 우리는 그 구멍과 구멍 사이에 연결된 작은 실 하나를 보게 된다.
작가는 마치 ‘수동적 의존성’에 빠진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부검하는 검시관처럼 그 이면과 그 관계를 필사적으로 파헤쳐 들어간다.
조안영은 이 작업을 미스터리와 추리라는 형식을 빌려 진행했는데, 사건의 진실이 하나하나 드러날수록 우리의 믿음과 예상은 보기 좋게 어긋나버린다.
말하자면 이 소설은 플롯 자체가 하나의 주제인 이야기이다.
그리고 결국 도달한 곳에서 우리가 마주한 실체는 우린 어쩌면 하나의 악기에 연결된 줄이라는 것, 다른 줄이 튕겨질 때마다 우리의 줄 또한 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줄들을 한데 모아놓은 ‘울림통’이 바로 이 소설이다.
- 소설가 이기호, 서평
인지
암묵적 기억
회피
해리
스키마
고해
작가의 말
추천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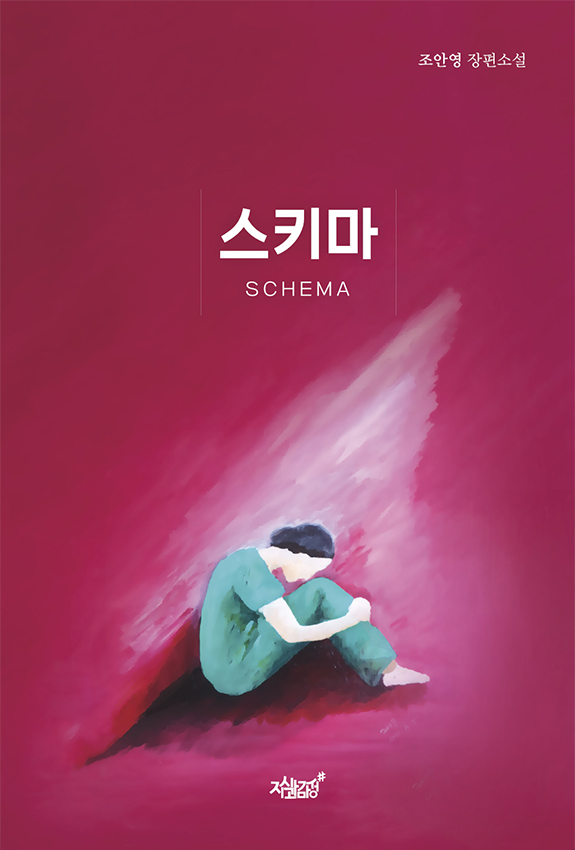

 070-4651-3730
070-4651-3730 ksbookup@naver.com
ksbookup@naver.com 지식과감성# 카카오플러스 친구 추가
지식과감성# 카카오플러스 친구 추가